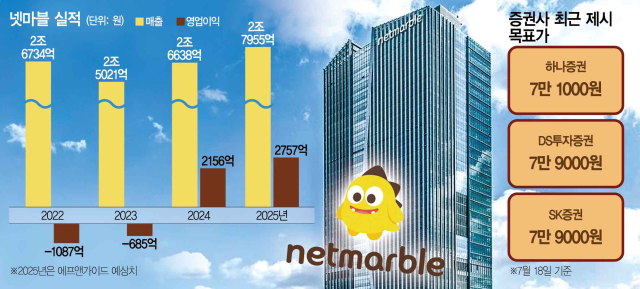엔비디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시총) 4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됐다. 직원 수가 3만명 남짓인 ‘지구상 가장 작은 대기업’이 만든 기적이다. 불과 2년 전인 2023년 5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챗GPT로 상징되는 생성형 AI 시대에 최대 수혜주로 부상한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에는 2조 달러, 같은 해 6월 3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어 일년 만인 올 여름 4조 달러 고지에 올랐다.
딥시크 충격에 판 바꾼 엔비디아
누구보다 빠른 로켓 성장으로 보이지만 지난 1년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동을 겪었다. 올 초에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소한의 컴퓨팅 인프라로 강력한 추론 모델 R1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 위기론이 불거졌다. 더 이상 엔비디아의 AI칩을 대규모로 장만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과 함께 하루 만에 5890억 달러(약 820조원)이 증발했다. 이는 나스닥 역사상 최대 낙폭으로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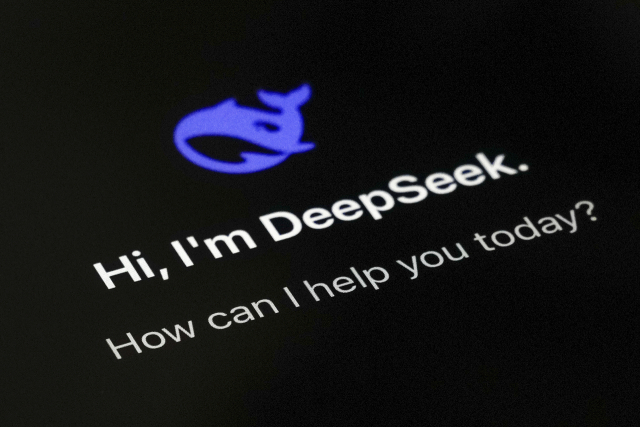
엔비디아는 불확실성 앞에서 움츠러드는 대신 정면 기회 요인을 살폈다. 추론 모델의 성장을 부인하기 보다는 정면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3월 열린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GPU Technology Conference) 2025’에서 대규모 AI 추론 모델의 연산 부담을 분산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인 ‘다이나모(Dynamo)’를 발빠르게 공개하고 일를 오픈소스로 풀었다. 추론 시장은 엔비디아의 무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뒤엎으며 글로벌 AI 추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의 이 같은 행보는 단 번의 전략이 아니라 ‘꾸역꾸역 해내는(Muddling Through)’ 정신의 산물에 가깝다.
‘꾸역꾸역 해내기’의 힘
1959년 미국의 정치학자인 찰스 린덜롬은 공공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면서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라는 논문을 내놨다. 이상적·합리적 결정이 아닌 즉흥적 조정과 시행착오가 조직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임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진주의’로 번역되지만, 이 개념의 진짜 핵심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방식’에 있다. 보통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쏟아지는 예상 불가능한 상황에 헤매지만 어떻게든 실행하며 방향을 찾아 나아간다는 뜻에 가깝다. 결국 전략보다는 변화 수용, 계획보다는 실행에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 미래의 변화가 빠르고 이에 대한 정보나 자원의 제약이 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상황에 타협하고 전환(피벗)을 통해 일단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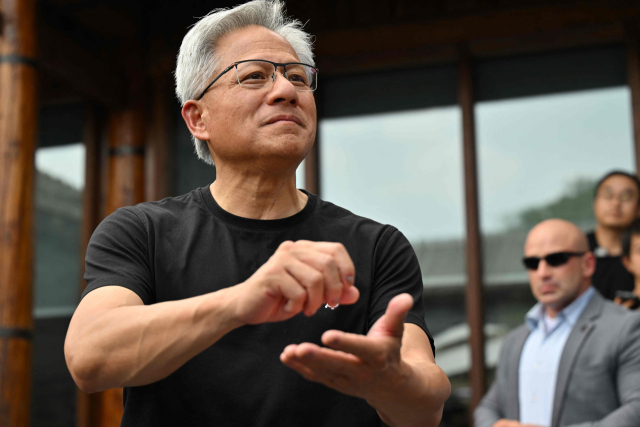
피벗의 철학: 외길 대신 다중센서 전략
엔비디아의 파괴적 혁신도 이 같은 차원에서 진행됐다. 처음에 비디오 게임 시장에 생생한 화질을 구현하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뛰어 들었으나 불과 두 번째 제품을 계약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한다. 일본 게임사인 세가(SEGA)와 대규모 파트너십을 맺고 NV2를 개발·제공하기로 했는데 엔비디아가 채택한 기술 표준인 사각형 폴리곤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채택한 표준과 달랐던 것이 문제였다.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윈도95의 다이렉트X에서 삼각형 폴리곤만을 지원하겠다고 못 박으며 제품의 생명력을 끊었다. ‘세가와의 계약을 파기하느냐 홀로 외딴 표준에 갇힐 것인가’의 딜레마 상황에서 젠슨 황은 자신의 기술 철학을 꺾고 삼각형 표준으로의 전환을 결정한다. 고집 대신 생존, 계획보다 조정이었다.
‘그래픽카드 회사’가 AI 기업이 되기까지
“세계 최초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소개합니다.” 1999년 최초의 GPU인 지포스 256을 소개했을 때도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는 막연히 GPU 제품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는 외부 개발자들에게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개방해 직접 렌더링 함수를 작성해 저마다 자신들이 개발하는 게임에 맞춰 시각적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방편이었다. 이후 2년 뒤인 2001년 지포스 3을 출시하면서 실제로 이 구상에 다가갈 수 있었고 그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3배 상승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진짜 도약은 그 이후다. GPU의 병렬 연산 성능이 단백질 구조 계산, 스톡 옵션 모델링 등 비그래픽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한 젠슨 황은 새로운 시장을 포착한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오늘날 엔비디아의 핵심 해자인 프로그래밍 모델 쿠다(CUDA)였다.
단 몇 사람의 인력으로 2006년 쿠다를 처음 내놨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젠슨 황은 대학을 돌며 연구자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 콘텐츠를 나눴다. 10년을 버텨야 겨우 빛을 봤다. 다운로드 수는 2009년 정점을 찍고 3년간 하락했다. 주가는 부진했고 이사회에서는 공매도 우려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젠슨 황은 지진 처리, 기상 시뮬레이션, 양자화학, 유체역학까지 모든 문을 두드렸다. 새로운 기술이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집요한 믿음 하나로.
“우리의 미션은 GPU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션은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해서 일반적인 컴퓨터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미 컬럼비아대 비즈니스스쿨의 코스티스 마글라라스 학장과의 대담 중에서)
“제로 빌리언 달러 시장으로 간다”
결국 2015년 모바일 칩 테그라 개발을 중단하고 모바일 시장에서 철수했을 때 그간 뿌려둔 씨앗은 빛을 봤다. 엔비디아가 모바일 시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을 무렵 젠슨 황의 센서는 동시에 여러 분야를 향하고 있었다. 젠슨 황과 엔비디아 연구팀들은 다양한 과학자들을 만나고 최신 논문들을 검토하면서 이미 물밑에서 과학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후에 이렇게 술회했다.
“더 이상 의지할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객도 없고 경쟁사도 없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장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없는 시장인 ‘제로 빌리언 달러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봇공학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딥러닝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최초의 AI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엔비디아다. 세계 최초의 AI 슈퍼컴퓨터, AI 전용 반도체 생태계, 전 세계 모든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쓰는 AI 인프라가 엔비디아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엔비디아의 성공을 두고 ‘비전이 명확했기 때문에 달랐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엔비디아의 성공은 명확하지 않아도 매번 꾸역꾸역 해냈기 때문에 다가왔다는 쪽에 가깝다.
변화를 포착할 때마다 과감히 방향을 바꾸고 실행했고 틀리더라도 이에 대응해 나아갔고 겉으로 정체돼 보이는 시기조차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시총 1위에도 주가에 일희일비 않는다

특히 시총 1위의 거물이 됐을 때도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엔비디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8월 엔비디아의 주가는 높은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차기 아키텍처인 블랙웰 시리즈의 출하 지연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간 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락했다. 불과 6월에 시총 3조 달러에 진입해 단 꿈을 만끽한 지도 몇 달 안 돼 엔비디아의 위기론이 계속됐다. TSMC와의 갈등론도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서두르기 보다는 천천히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를 바로 잡았다.
“전적으로 이번 블랙웰 시리즈의 디자인 결함은 엔비디아의 잘못(fault)으로 비롯됐습니다. TSMC가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파트너와의 신뢰를 지켜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 훨씬 값진 자산을 지켜냈다.
“주가가 80퍼센트 이상 떨어졌을 때도, 제 반응이나 심장 박동은 오늘과 같았습니다. 물론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바뀐 것이 없다면, 다시 회사로 가서 하던 대로 집중하면 됩니다.”
- 2024년 스탠퍼드대 경영대학 대담 중에서
젠슨 황이 30년 넘게 보여준 ‘꾸역꾸역 해내기’의 미학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패를 견디는 리더십, 틀린 길에서도 멈추지 않는 실행력, 누구도 가지 않던 길을 ‘먼저 만들어버리는’ 용기가 만든 꾸역꾸역의 미학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단독]미래에셋, 2차전지 천보 자회사 2대 주주 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18/2GVEC93H8L_2_s.jpg)

![허준홍 등 GS 오너가 100억…재벌들 비상장사로 '배당 잔치'[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13/2GVC12HU4I_3_s.png)
![주가 3배 뛴 에이피알, 1300억 중간 배당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13/2GVC1EIN87_7_s.jpg)
![공매도 투자자의 픽은…SKC·한미반도체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13/2GVC13F36E_1_s.jpg)
![3200선 돌파한 코스피…"훈풍 지속"vs"조정 갈 것"[주간 증시 전망]](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H3UWNW_2_s.jpg)


![경영진 지분 매도에도…"실적 상승세 계속된다" 실리콘투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FPECZS_9_s.png)
![[단독]“일본 라이온 빠졌다"…애경산업 인수전 3파전으로](https://newsimg.sedaily.com/2025/07/18/2GVEBNMZ41_1_s.jpg)
![[단독] 코스피 치솟자…美 헤지펀드, 국장 투자 ‘밀물’](https://newsimg.sedaily.com/2025/06/25/2GU7NP5DK7_1_s.jpg)
![[단독] “AI칩 급성장”…삼성전자 '평택 P5' 2년만에 재개 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25/07/01/2GV6KLCA5A_6_s.jpg)
![[단독]현대차, 부동산서 '2조 실탄' 만든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06/2GV8UU0FR5_6_s.jpg)
![[단독]'불닭신화' 삼양식품, 창사 이래 최대 M&A 나섰다…지앤에프 인수](https://newsimg.sedaily.com/2025/07/11/2GVB56QSZE_12_s.jpg)
![[단독]VL인베, 베올리아의 폐기물 계열사 인수 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25/07/18/2GVED9Q9LJ_6_s.jpg)
![[단독] 한화솔루션, 리츠 만든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08/2GV9RGVRPC_3_s.jpg)
![[단독] 모회사 주주에 보상 강화…'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https://newsimg.sedaily.com/2025/07/06/2GV8U8YJQL_10_s.jpg)
![[단독] "지금은 육성이 우선"…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70O5JTU_2_s.jpg)